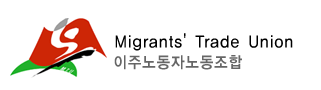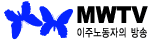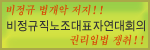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
【원주=뉴시스】강은혜 기자 = 더위가 극에 달했다. 연일 이어지는 피서객들로 전국의 도로는 북새통을 이룬다. 하지만 한 켠에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타향살이 중인 이주노동자들도 그 중 하나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 휴가는 사치에 가깝다. 찌는 여름, 여행객들 뒤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그들을 찾았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 위치한 '함께 하는 공동체'는 이주노동자를 후원하는 단체. 기자가 방문한 날은 마침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이 있는 날이었다.
오후 5시께가 되자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일요일 오후나 돼야 한국어 공부를 할 짬이 나는 것은 주말도 따로 없이 일해야 하는 까닭이다.
처음으로 문을 연 것은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마타씨(45·여·태국). 이곳에 온 지는 햇수로 5년째라고 했다. 태국에 있는 딸 둘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지만 일은 생각만큼 순탄치 않았다. 무리한 작업으로 팔에 마비 증세가 오자 일터에서는 치료비 한 푼 없이 그녀를 내몰았다. 일터를 옮기면서 공장 기숙사에서 그나마 함께 생활하던 남편과도 졸지에 이산가족이 돼버렸다. 지금 일하는 곳은 처우가 나쁘지 않느냐는 질문에 야근만 하는 정도라 일하기 좋은 편이라며 싫은 소리를 꺼리는 모습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작업장에서는 휴가도 받았다. 휴가라 봐야 남들 쉬는 주말을 이제야 챙기는 정도지만 협회에서 마련한 캠프에 참가할 수 있어 좋았다며 싱글벙글했다.
손 잭씨(28·캄보디아)는 그나마 협회에서 마련한 휴가도 다녀오지 못한 케이스였다. 맨홀 뚜껑을 제작하는 공장에서 근무 중인 그는 갓 1년째 한국 생활 중이다. 그의 평균 노동 시간은 13시간. 가장 힘든 점이 무어냐고 묻자 그런 것 없다고 손사래를 치다가 기자의 추궁에 캄보디아보다 더 더운 것 같아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한국 음식도 이제 제법 입에 맞고 한국 사람도 다들 좋단다. 그래도 간혹 이곳에서 안 좋지 않은 일을 겪거나 하진 않느냐는 질문에 "캄보디아에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중국에서 온 유수옥씨(33·여)도 같은 대답이었다. 전에 다니던 공장에서는 급여가 밀리는 등 마찰을 빚었지만 지금 일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는 나쁘지 않다며 "나쁜 사장님도 있는데 착한 사장님도 있어요"라고 말을 아꼈다. 이주 노조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더 삼가는 모습이었다. 손짓 발짓에 영어를 섞은 질문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일축하던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관심이 없다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일까. 어떻게 13시간을 내리 일하면서 1년에 한 번 쉬는 휴가 때문에 싱글벙글할 수 있을까.
원래도 열악했지만 지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좋지 않다. G20 정상회의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노조 성립을 두고 단식 투쟁 중이던 노조 위원장 미셸씨(38·필리핀)는 6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인 이주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해도 사용자와의 관계 악화를 두려워하는 특성상 참여가 적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기가 힘든 이들에게 사용자와의 관계 악화는 가장 두려운 일 중 하나다. 해고라도 당했다가는 하루 아침에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이 찍힐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조란 먼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다. 특히 지방 노동자의 경우는 협소한 작업장 특성상 더한 것이다.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각 국에 이주노조 설립에 대한 권고를 낸 상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의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루 12∼13시간을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우리 사회에는 분명 존재한다. 경제 강국이라는 목표에는 다소 뒤처진 인권 대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pens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