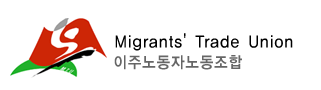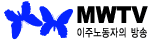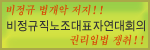글 수 3,514
미등록 이주자의 ‘빵과 장미’ /
정정훈/‘공감’ 변호사
한겨레 기사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53324.html
“내일의 빵으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검은 영혼의 시인 랭스턴 휴스는 이렇게 ‘내일’이라는 장밋빛 미래의 약속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오늘의 자유’를 선언했다. 대선 정국이 한창이다. ‘오늘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약으로 제시되는 ‘내일의 약속’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유독 ‘오늘의 자유’도 ‘내일의 빵’도 없는 예외적 존재들이 있다.
우리가 쉽게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리는 미등록 이주자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외국 인력’이었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 살아가거나 내보내진다. 노동력을 부르면 ‘사람’이 함께 들어오고, ‘사람’ 자체는 합법·불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외국 인력’과 ‘불법 체류자’라는 규정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보지 않았다.
불법이라는 숙명적 굴레를 딛고 ‘오늘의 자유’를 실천한 이 시대의 전태일들이 있었다. 이주노동자조합을 만들어 ‘우리도 사람이고 노동자’라고 선언했다. 힘겨운 싸움 끝에 고등법원에서도 그들의 조직과 권리선언을 인정했다. 그런데 11월27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의 핵심 활동가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단속하여 수용했다. 일상적인 단속활동이었을 뿐 ‘표적’은 없었다는 변명으로는 이 ‘기막힌 우연’이 설명되지 않는다. ‘합법’ 노조에서 ‘불법 사람’들을 제거하여 노조를 빈 형식으로 만들려는 권력의 의지를 나만 보는가? ‘불법인 너희들이 감히!’라고 말하는 권력의 오만함을 나만 느끼는가? ‘빵과 자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권력의 음험한 경고를 나만 듣는가? 이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 단속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살고 싶으면 죽어 지내라!’
‘사람’과 ‘삶’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공권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권한 행사는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통 버리듯, 다 쓴 건전지 폐기처분하듯 간단했다. 출입국관리소의 권한이 통제되지 않고 ‘천당에서 지옥까지의’ 절대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지워버린 구체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체류’는 ‘불법’이지만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다.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하며, 외로울 때 함께할 친구와 노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피해를 신고하러 간 경찰서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고,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이 나라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 ‘미등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왜곡되는 삶의 조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그 대답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주 한국영사관은 ‘불법 체류자’인 재외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영사관 신분증은 주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서 인정되고, 전기·수도·전화신청·은행계좌 개설에까지 쓰이고 있다고 한다. 영사관이 그들을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들이다.
‘불법 체류자’인 재외국민과 우리 안의 이주민들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를 수는 없다. ‘공존’의 현실과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살고 싶으면 죽어 지내라’는 권력의 주술을 풀어야 한다. 빵을 구걸하기 위해 오늘의 자유를 포기하라고? 그들도 우리처럼 ‘빵과 장미’ 모두가 필요하다. 함께하는 삶을 위한 제도를 모색할 때다.
정정훈/‘공감’ 변호사
정정훈/‘공감’ 변호사
한겨레 기사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253324.html
“내일의 빵으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검은 영혼의 시인 랭스턴 휴스는 이렇게 ‘내일’이라는 장밋빛 미래의 약속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오늘의 자유’를 선언했다. 대선 정국이 한창이다. ‘오늘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약으로 제시되는 ‘내일의 약속’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유독 ‘오늘의 자유’도 ‘내일의 빵’도 없는 예외적 존재들이 있다.
우리가 쉽게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리는 미등록 이주자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외국 인력’이었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 살아가거나 내보내진다. 노동력을 부르면 ‘사람’이 함께 들어오고, ‘사람’ 자체는 합법·불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외국 인력’과 ‘불법 체류자’라는 규정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보지 않았다.
불법이라는 숙명적 굴레를 딛고 ‘오늘의 자유’를 실천한 이 시대의 전태일들이 있었다. 이주노동자조합을 만들어 ‘우리도 사람이고 노동자’라고 선언했다. 힘겨운 싸움 끝에 고등법원에서도 그들의 조직과 권리선언을 인정했다. 그런데 11월27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주노조의 핵심 활동가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단속하여 수용했다. 일상적인 단속활동이었을 뿐 ‘표적’은 없었다는 변명으로는 이 ‘기막힌 우연’이 설명되지 않는다. ‘합법’ 노조에서 ‘불법 사람’들을 제거하여 노조를 빈 형식으로 만들려는 권력의 의지를 나만 보는가? ‘불법인 너희들이 감히!’라고 말하는 권력의 오만함을 나만 느끼는가? ‘빵과 자유’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권력의 음험한 경고를 나만 듣는가? 이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표적 단속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살고 싶으면 죽어 지내라!’
‘사람’과 ‘삶’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공권력은 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권한 행사는 유통기한 지난 통조림통 버리듯, 다 쓴 건전지 폐기처분하듯 간단했다. 출입국관리소의 권한이 통제되지 않고 ‘천당에서 지옥까지의’ 절대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지워버린 구체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체류’는 ‘불법’이지만 ‘사람’이 불법일 수는 없다. 그들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아플 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어야 하며, 외로울 때 함께할 친구와 노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피해를 신고하러 간 경찰서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되고,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이 나라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 ‘미등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왜곡되는 삶의 조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함께 살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그 대답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주 한국영사관은 ‘불법 체류자’인 재외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재외국민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영사관 신분증은 주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서 인정되고, 전기·수도·전화신청·은행계좌 개설에까지 쓰이고 있다고 한다. 영사관이 그들을 그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들이다.
‘불법 체류자’인 재외국민과 우리 안의 이주민들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를 수는 없다. ‘공존’의 현실과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살고 싶으면 죽어 지내라’는 권력의 주술을 풀어야 한다. 빵을 구걸하기 위해 오늘의 자유를 포기하라고? 그들도 우리처럼 ‘빵과 장미’ 모두가 필요하다. 함께하는 삶을 위한 제도를 모색할 때다.
정정훈/‘공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