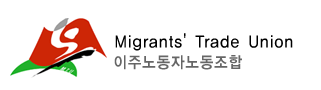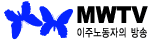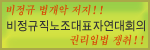글 수 3,514
노무현 정부의 인종차별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죽였다
2월 11일 여수 보호소 화재 사건으로 감금된 이주노동자 55명 중 9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것이라 한다.
화재 당시, 여수 '보호소'의 화재경보기도, 스프링쿨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아저씨, 문을 열어달라. 빨리빨리" 이주노동자의 절규가 메아리쳤다.
여수 '보호소' 직원들은 화재 신고도 하지 않았고, 문을 열어 주지도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유독가스와 불길을 피해 1인용 화장실에 아홉 명이 대피했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온갖 고된 노동을 감수했던 이주노동자들. 인간사냥식 단속으로 끌려왔던 그들은 짐승처럼 감금된 채 불길 속에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어갔다.
이 참사는 양식 있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다. 우리는 이 치욕과 참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진정한 살인범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야말로 그 주범이다.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인 인종차별적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이 죄없는 이들을 죽였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6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당했다. 연행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노동자도 많다. 그래서 이주노조는 여수 ‘보호소’ 참사를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이주노동자들까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수갑을 채웠다. 정부 정책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중시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출입국관리소와 경찰, 보수 언론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참극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랄한 수작을 벌이고 있다. 한 중국인 이주노동자가 화재가 나기 전 CCTV를 가린 것을 두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정작 CCTV 촬영 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동대책위의 공동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당일 과학수사대의 현장 검증에서 발견되지 않은 ‘라이터’가 그 다음 날에 불에 타지 않은 채 '발견'됐다.
사망자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는 데서 그 비열함은 극에 달했다. 유족들의 화재현장 접근도 막고 있다. 유족들과 제대로 된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법무부와 경찰 등 살인의 주범들이 진상을 규명할 순 없다. 오히려 그들은 처벌 대상일 뿐이다. 법무부 장관은 퇴진하라.
반인권적 ‘보호’ 시설을 당장 폐쇄하라.
야만적인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하라.
2007년 2월 24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위원회
2월 11일 여수 보호소 화재 사건으로 감금된 이주노동자 55명 중 9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 것이라 한다.
화재 당시, 여수 '보호소'의 화재경보기도, 스프링쿨러도 작동하지 않았다. "아저씨, 문을 열어달라. 빨리빨리" 이주노동자의 절규가 메아리쳤다.
여수 '보호소' 직원들은 화재 신고도 하지 않았고, 문을 열어 주지도 않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유독가스와 불길을 피해 1인용 화장실에 아홉 명이 대피했다.
'코리안드림'을 품고 온갖 고된 노동을 감수했던 이주노동자들. 인간사냥식 단속으로 끌려왔던 그들은 짐승처럼 감금된 채 불길 속에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죽어갔다.
이 참사는 양식 있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이다. 우리는 이 치욕과 참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진정한 살인범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야말로 그 주범이다.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인 인종차별적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정책이 죄없는 이들을 죽였다.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6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추방당했다. 연행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노동자도 많다. 그래서 이주노조는 여수 ‘보호소’ 참사를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 이주노동자들까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수갑을 채웠다. 정부 정책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중시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출입국관리소와 경찰, 보수 언론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참극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랄한 수작을 벌이고 있다. 한 중국인 이주노동자가 화재가 나기 전 CCTV를 가린 것을 두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정작 CCTV 촬영 기록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동대책위의 공동 진상조사단 구성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당일 과학수사대의 현장 검증에서 발견되지 않은 ‘라이터’가 그 다음 날에 불에 타지 않은 채 '발견'됐다.
사망자 유가족의 절규를 외면하는 데서 그 비열함은 극에 달했다. 유족들의 화재현장 접근도 막고 있다. 유족들과 제대로 된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법무부와 경찰 등 살인의 주범들이 진상을 규명할 순 없다. 오히려 그들은 처벌 대상일 뿐이다. 법무부 장관은 퇴진하라.
반인권적 ‘보호’ 시설을 당장 폐쇄하라.
야만적인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하라.
2007년 2월 24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중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