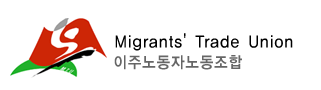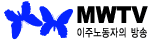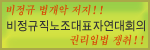글 수 3,514
[고미숙의 行설水설]‘미누의 귀환’을 기원하며
고미숙 고전평론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면 속의 미누는 여전히 밝고 건강했다. 화면 뒤편으로 히말라야가 우뚝 서 있었다. 그렇다! 미누는 지금, 고향 네팔에 있다. 20대 초반, 남산타워와 88올림픽에 반해 한국에 온 지 꼭 18년 만이었다. 18년만의 귀환! 단지 이 말만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뭉클해질 것이다. 이역만리, 고난에 찬 타향살이, 눈물의 상봉 등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테니까. 하지만, 이 경우엔 그런 감상적 해석을 여지없이 깨버린다. 미누는 귀환한 것이 아니라, 추방당했기 때문이다. 18년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다가 지난 10월 초 표적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감금되었고, 보름 뒤 비행기에 실려 고향땅에 ‘내팽개쳐’졌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면 속의 미누는 여전히 밝고 건강했다. 화면 뒤편으로 히말라야가 우뚝 서 있었다. 그렇다! 미누는 지금, 고향 네팔에 있다. 20대 초반, 남산타워와 88올림픽에 반해 한국에 온 지 꼭 18년 만이었다. 18년만의 귀환! 단지 이 말만 들으면, 누구나 가슴이 뭉클해질 것이다. 이역만리, 고난에 찬 타향살이, 눈물의 상봉 등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갈 테니까. 하지만, 이 경우엔 그런 감상적 해석을 여지없이 깨버린다. 미누는 귀환한 것이 아니라, 추방당했기 때문이다. 18년간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다가 지난 10월 초 표적단속에 걸려 보호소에 감금되었고, 보름 뒤 비행기에 실려 고향땅에 ‘내팽개쳐’졌다.
추방 당하기 전 빛나는 18년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을까마는, 이럴 때 고향은 뭐라고 해야 할까? 고향이 소중한 건 그것이 생명의 뿌리이자 삶의 토대이기 때문일 터. 그렇다면 미누에게 고향은 바로 이곳 ‘한국’이다.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한국에서 보냈으므로. 아마도 네팔 공항에 내리는 순간, 미누는 정글이나 사막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으리라. 자기가 태어난 곳이 유배의 땅이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그가 화성보호소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의 친구들은 눈물겹게 뛰어다녔다. 그 열성에 부응하여 경향신문은 ‘미누 이야기’를 1면 톱기사로 다루었고, 심지어 MBC 9시 뉴스 전파를 타기도 했다. 내심 기대가 없지 않았다. 이 정도로 ‘뜨면’ 정부에서도 뭔가 정상참작이란 걸 하지 않을까, 하는. 하지만 결과는 추방이었다. 그것도 작별의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참담하고 허탈했다. 18년간 그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친구가 어찌나 많았던지 보호소에선 면회 스케줄을 조정해야 할 정도였다. 하여, 미누의 추방은 당사자보다 그 친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남겼다. 법과 제도의 폭력성은 그렇다치고, 언론이 그토록 무기력할 줄이야. 경향신문과 MBC가 특별히 무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힘이 센 건지, 어느 쪽이건 씁쓸하긴 마찬가지다.
미누는 내가 몸담고 있는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식구’였다. 미누가 반했던 남산타워 바로 밑에서 몇 년간 한솥밥을 먹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이주노동자방송국과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 탓이다. 노래면 노래, 요리면 요리 못하는 게 없었지만, 그는 무엇보다 웃음의 달인이었다. 어허허허! 지금도 그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미누의 친화력은 실로 ‘가공할’ 수준이다. 일단 인사를 나누고 나면 그와 친구가 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러운
존재 자체가 ‘움직이는 네트워크’라고나 할까. 아마 지금쯤 ‘유배지’ 네팔에서 또 다른 친구들과의 새로운 연대를 기획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또한 미누와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정이 국경보다 더 강하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 우정의 힘으로 미누가 다시 귀환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청춘의 고향이자 수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으로. 그때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당당한 자유인의 몸으로. Free 미누!
덧붙이면, 미누가 네팔에서 보낸 영상편지를 보고 있을 때, 경향신문에서 칼럼 청탁이 왔다. 하필 그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면, 이 칼럼 또한 미누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셈이다. 칼럼 명칭인 ‘行설水설’은 연구실 후배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말’이라는 뜻이다. 앞으로 여기에 실릴 말들이 소박하지만 매끄러운 길을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미누와 우리, 이주민과 한국인을 잇는, 아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
댓글 0
- ㅣ
- 0
- ㅣ
- 0

추방 당하기 전 빛나는 18년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가 어디 있을까마는, 이럴 때 고향은 뭐라고 해야 할까? 고향이 소중한 건 그것이 생명의 뿌리이자 삶의 토대이기 때문일 터. 그렇다면 미누에게 고향은 바로 이곳 ‘한국’이다. 청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한국에서 보냈으므로. 아마도 네팔 공항에 내리는 순간, 미누는 정글이나 사막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으리라. 자기가 태어난 곳이 유배의 땅이 되어버리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그가 화성보호소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 그의 친구들은 눈물겹게 뛰어다녔다. 그 열성에 부응하여 경향신문은 ‘미누 이야기’를 1면 톱기사로 다루었고, 심지어 MBC 9시 뉴스 전파를 타기도 했다. 내심 기대가 없지 않았다. 이 정도로 ‘뜨면’ 정부에서도 뭔가 정상참작이란 걸 하지 않을까, 하는. 하지만 결과는 추방이었다. 그것도 작별의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참담하고 허탈했다. 18년간 그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다. 친구가 어찌나 많았던지 보호소에선 면회 스케줄을 조정해야 할 정도였다. 하여, 미누의 추방은 당사자보다 그 친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남겼다. 법과 제도의 폭력성은 그렇다치고, 언론이 그토록 무기력할 줄이야. 경향신문과 MBC가 특별히 무력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힘이 센 건지, 어느 쪽이건 씁쓸하긴 마찬가지다.
미누는 내가 몸담고 있는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식구’였다. 미누가 반했던 남산타워 바로 밑에서 몇 년간 한솥밥을 먹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이주노동자방송국과 같은 공간을 쓰고 있는 탓이다. 노래면 노래, 요리면 요리 못하는 게 없었지만, 그는 무엇보다 웃음의 달인이었다. 어허허허! 지금도 그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미누의 친화력은 실로 ‘가공할’ 수준이다. 일단 인사를 나누고 나면 그와 친구가 되지 않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러운
존재 자체가 ‘움직이는 네트워크’라고나 할까. 아마 지금쯤 ‘유배지’ 네팔에서 또 다른 친구들과의 새로운 연대를 기획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또한 미누와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정이 국경보다 더 강하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그 우정의 힘으로 미누가 다시 귀환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청춘의 고향이자 수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으로. 그때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당당한 자유인의 몸으로. Free 미누!
덧붙이면, 미누가 네팔에서 보낸 영상편지를 보고 있을 때, 경향신문에서 칼럼 청탁이 왔다. 하필 그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보면, 이 칼럼 또한 미누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셈이다. 칼럼 명칭인 ‘行설水설’은 연구실 후배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물처럼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말’이라는 뜻이다. 앞으로 여기에 실릴 말들이 소박하지만 매끄러운 길을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미누와 우리, 이주민과 한국인을 잇는, 아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