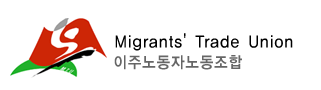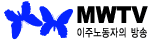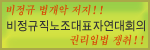글 수 3,514
살아도 살아도... '마음' 받아주지 않는 한국
방글라데시 출신 마포즈 라만의 경우
마포즈 라만은 방글라데시인 노동자다. 한국에 온지 12년. 올해 38살이다. 대부분을 충남 천안에서 살았다. 건설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거나 미장을 한다. 쉬는 날 없이 일하다 보니 시멘트 반죽도 잘 말고, 미장도 곧잘 하게 됐다. 현장에서 그는 숙련공 노임 7만 원을 받는다. 내국인 숙련공의 절반 수준이다. 불법체류자 치고는 잘 받는 월급이다.
그의 당돌한 제보로 우리는 만나게 됐다. 전화로 접한 그의 이야기는 타향에서 돈 떼여 서글픈 노동자 이야기였다. 일은 끊긴 처지에 몸까지 아픈 처지였다. '추석을 앞둔 9월 말 이 30대 후반 남자는 얼마나 고향생각이 날까.' 망향가를 취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를 만났지만, 그는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다. 그의 한숨엔 '아무리 살아봐도 영영 이방인'이라는 설움이 짙게 묻어났다.
석 달 치 밀린 일당 1백만 원을 받으러 '사장형님'을 찾아 갔다가, 검지만한 큰 못을 빼는 데 쓰는 '빠루'로 수십 대를 맞았다고 했다. 왼쪽 두상엔 꿰맨 자국이 있었고, 상처엔 머리털이 없었다.
마포즈는 어제 일처럼 맞던 날을 떠올렸다. 입은 옷이 피로 젖을 만큼 심한 매질이었다. 맞으면서도 그는 사장 '형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 이었다. "형님 어려우면 나중에 올게요." 독촉은 하러갔지만 술에 취한 사장을 보고 그는 마음이 이내 측은해졌다고 한다. "형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가 내게 따지듯 말했다. 계약관계인 '사장'보다, 오래 함께 일한 '형님'으로 믿고 따른 사람에게 폭행당한 그는 험한 마음을 가누고 있었다.
공감하는 처지로 살아온 이웃
추석을 앞둔 마포즈의 망향가를 제작하겠다는 취재보고 덕에 그의 이야기는 기사가 됐다. 하지만 그는 고향의 추억이라고 떠올릴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보여준 고향사진엔 싸릿대 같은 목초로 엮은 허름한 건물 하나만 있었다. 그는 전기도 없고 자기 방도 없는 곳에서 유년을 보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수도 다카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할 수 있었다. 늘 떠나고 싶었던 탓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를 일이다.
그가 한국에 온 97년은 IMF구제금융 사태로 건설경기가 최악이던 때였다. 산업연수생 자격의 합법적인 처지였음에도, 그는 수천만 원의 월급을 떼였다. 하지만 그는 용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TV에서 금모으기 까지 하는 장면을 보고, 사장님과 사장님의 친구가족도 모두 힘든 처지란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억울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건 '고통분담'이었다"는 답을 했다. '한국의 이웃들처럼 나도 무언가 참아야지.' 26살이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공동체 의식이랄까. 그의 당연한 듯 담담한 표정을 보고 나는 놀랐다.
2년 전 그는 소중한 이웃을 얻었다. 바로 옆집 사는 김효순 할머니 부부에게 정을 붙였다. 막내아들 벌인 그를 노부부는 '마포주'라고 부른다. 오토바이로 일 보러 나갈 때면 차 걱정을 잊지 않고, 돌아오면 끼니 걱정으로 하루를 닫는다. 옆집, 아니 바로 옆방이웃인 세 사람은 혈육처럼 부대끼고 있다. 태어날 적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셨던 그는 우리말로 배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마포즈가 맞고 병실에 입원한 날, 김효순 할머니는 갑상선 수술을 일주일 앞둔 처지였다. 하지만, 그가 천안시내 병원에 입원하던 날,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곳까지 걸음을 아 끼지 않았다. 입원장소가 중환자실이라 면회가 어렵게 되자 편지를 남겼다. 간곡히 부탁한 끝에 간호사에게 쌈짓돈 3만원을 남기고 돌아섰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마포즈… 어서 건강하게 돌아와 주길 바래. 이 할머니가 매일 기도할게. 그리고 작은 정성 받아주어." A4용지 한 가득 일고여덟 줄 남짓 큰 글씨로 눌러쓴 편지. 마포즈는 네 번 접어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편지를 보여줬다. 그는 편지를 읽어주다 말고 울었다.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난단다. 내게 이런 조부 조모가 계시다는 생각에 북받치는 듯 했다.
12년을 한국에서 산 38살 마포즈 라만은 한국에 정을 붙였다. 김효순 할머니는 마포즈더러 한국 사람보다 정이 많다고 했다. 사랑받게끔 행동한다며 그를 쓰다듬었다. 사랑받게끔 사는 사람은 정을 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다른 한국 사람들이 고단하게 사는 걸 안다. 마포즈의 일당을 체불하고 그를 폭행한 사장도 처지가 답답해 술을 먹고 있었을 게다. 마포즈는 이웃이란 자들의 고통도 막연히 이해하며 힘든 세월을 버텼다. 차별과 폭력만이 돌아오더라도 정이 많은 그는 그렇게 보통사람처럼 산다.
계속되는 추방…20만 명의 이웃 아닌 이웃
얼마 전 몽골인 이주노동자 출신 문화운동가 미누의 추방소식을 접했다. 그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행사마다 빼놓을 수 없는 초대가수였다고 한다. 2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이 땅에 함께 사는 시대. 그의 존재가 곧 물음이고 꼭 필요한 문제제기였지만, 제도는 불편함을 참지 못했다. 법무부는 그가 불법체류자라는 간단한 사유로 그를 추방했다. 그의 추방을 화두로 어떤 기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했다. 보도에 공감하며, 나는 그의 추방소식에 어두웠던 자신을 탓했다.
나는 요즘도 가끔 마포즈 라만의 전화를 받는다. 자신이 나온 뉴스 원본을 DVD로 챙겨 소장할 만큼 멀티미디어에도 밝은 30대 후반의 아저씨. 최근 폭력을 행사한 사장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그는 늘 말한다. "병천순대 아시죠. 기자님. 그거 우리 동네 이름 딴 거예요. 다음에 꼭 오세요. 한 그릇 살게요." 그의 고향은 방글라데시 어느 마을이 아니라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이다.
방글라데시 출신 마포즈 라만의 경우
마포즈 라만은 방글라데시인 노동자다. 한국에 온지 12년. 올해 38살이다. 대부분을 충남 천안에서 살았다. 건설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거나 미장을 한다. 쉬는 날 없이 일하다 보니 시멘트 반죽도 잘 말고, 미장도 곧잘 하게 됐다. 현장에서 그는 숙련공 노임 7만 원을 받는다. 내국인 숙련공의 절반 수준이다. 불법체류자 치고는 잘 받는 월급이다.
그의 당돌한 제보로 우리는 만나게 됐다. 전화로 접한 그의 이야기는 타향에서 돈 떼여 서글픈 노동자 이야기였다. 일은 끊긴 처지에 몸까지 아픈 처지였다. '추석을 앞둔 9월 말 이 30대 후반 남자는 얼마나 고향생각이 날까.' 망향가를 취재한다는 생각으로 그를 만났지만, 그는 다른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었다. 그의 한숨엔 '아무리 살아봐도 영영 이방인'이라는 설움이 짙게 묻어났다.
석 달 치 밀린 일당 1백만 원을 받으러 '사장형님'을 찾아 갔다가, 검지만한 큰 못을 빼는 데 쓰는 '빠루'로 수십 대를 맞았다고 했다. 왼쪽 두상엔 꿰맨 자국이 있었고, 상처엔 머리털이 없었다.
마포즈는 어제 일처럼 맞던 날을 떠올렸다. 입은 옷이 피로 젖을 만큼 심한 매질이었다. 맞으면서도 그는 사장 '형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 이었다. "형님 어려우면 나중에 올게요." 독촉은 하러갔지만 술에 취한 사장을 보고 그는 마음이 이내 측은해졌다고 한다. "형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가 내게 따지듯 말했다. 계약관계인 '사장'보다, 오래 함께 일한 '형님'으로 믿고 따른 사람에게 폭행당한 그는 험한 마음을 가누고 있었다.
공감하는 처지로 살아온 이웃
추석을 앞둔 마포즈의 망향가를 제작하겠다는 취재보고 덕에 그의 이야기는 기사가 됐다. 하지만 그는 고향의 추억이라고 떠올릴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었다. 그가 보여준 고향사진엔 싸릿대 같은 목초로 엮은 허름한 건물 하나만 있었다. 그는 전기도 없고 자기 방도 없는 곳에서 유년을 보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수도 다카에서 영어영문학을 전공할 수 있었다. 늘 떠나고 싶었던 탓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를 일이다.
그가 한국에 온 97년은 IMF구제금융 사태로 건설경기가 최악이던 때였다. 산업연수생 자격의 합법적인 처지였음에도, 그는 수천만 원의 월급을 떼였다. 하지만 그는 용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TV에서 금모으기 까지 하는 장면을 보고, 사장님과 사장님의 친구가족도 모두 힘든 처지란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억울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건 '고통분담'이었다"는 답을 했다. '한국의 이웃들처럼 나도 무언가 참아야지.' 26살이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공동체 의식이랄까. 그의 당연한 듯 담담한 표정을 보고 나는 놀랐다.
2년 전 그는 소중한 이웃을 얻었다. 바로 옆집 사는 김효순 할머니 부부에게 정을 붙였다. 막내아들 벌인 그를 노부부는 '마포주'라고 부른다. 오토바이로 일 보러 나갈 때면 차 걱정을 잊지 않고, 돌아오면 끼니 걱정으로 하루를 닫는다. 옆집, 아니 바로 옆방이웃인 세 사람은 혈육처럼 부대끼고 있다. 태어날 적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셨던 그는 우리말로 배운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마포즈가 맞고 병실에 입원한 날, 김효순 할머니는 갑상선 수술을 일주일 앞둔 처지였다. 하지만, 그가 천안시내 병원에 입원하던 날,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곳까지 걸음을 아 끼지 않았다. 입원장소가 중환자실이라 면회가 어렵게 되자 편지를 남겼다. 간곡히 부탁한 끝에 간호사에게 쌈짓돈 3만원을 남기고 돌아섰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마포즈… 어서 건강하게 돌아와 주길 바래. 이 할머니가 매일 기도할게. 그리고 작은 정성 받아주어." A4용지 한 가득 일고여덟 줄 남짓 큰 글씨로 눌러쓴 편지. 마포즈는 네 번 접어 지갑에 넣고 다닌다는 편지를 보여줬다. 그는 편지를 읽어주다 말고 울었다.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난단다. 내게 이런 조부 조모가 계시다는 생각에 북받치는 듯 했다.
12년을 한국에서 산 38살 마포즈 라만은 한국에 정을 붙였다. 김효순 할머니는 마포즈더러 한국 사람보다 정이 많다고 했다. 사랑받게끔 행동한다며 그를 쓰다듬었다. 사랑받게끔 사는 사람은 정을 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다른 한국 사람들이 고단하게 사는 걸 안다. 마포즈의 일당을 체불하고 그를 폭행한 사장도 처지가 답답해 술을 먹고 있었을 게다. 마포즈는 이웃이란 자들의 고통도 막연히 이해하며 힘든 세월을 버텼다. 차별과 폭력만이 돌아오더라도 정이 많은 그는 그렇게 보통사람처럼 산다.
계속되는 추방…20만 명의 이웃 아닌 이웃
얼마 전 몽골인 이주노동자 출신 문화운동가 미누의 추방소식을 접했다. 그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행사마다 빼놓을 수 없는 초대가수였다고 한다. 2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이 땅에 함께 사는 시대. 그의 존재가 곧 물음이고 꼭 필요한 문제제기였지만, 제도는 불편함을 참지 못했다. 법무부는 그가 불법체류자라는 간단한 사유로 그를 추방했다. 그의 추방을 화두로 어떤 기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보도를 했다. 보도에 공감하며, 나는 그의 추방소식에 어두웠던 자신을 탓했다.
나는 요즘도 가끔 마포즈 라만의 전화를 받는다. 자신이 나온 뉴스 원본을 DVD로 챙겨 소장할 만큼 멀티미디어에도 밝은 30대 후반의 아저씨. 최근 폭력을 행사한 사장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휴대전화를 붙잡고 그는 늘 말한다. "병천순대 아시죠. 기자님. 그거 우리 동네 이름 딴 거예요. 다음에 꼭 오세요. 한 그릇 살게요." 그의 고향은 방글라데시 어느 마을이 아니라 충청남도 천안시 병천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