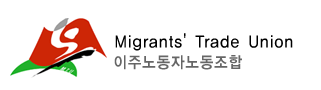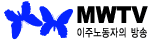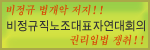글 수 3,514
[경향마당]너무 더딘 ‘이주노동자의 봄’
고영직 한국작가회의 대변인
 그러나 소위 ‘불법 사람’ 신세가 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곳도 없다. 아무도 아닌 자(Nobody), 즉 투명인간 내지는 불가촉천민 취급을 받는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오직 인내의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강요된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게 ‘고통은 견디는 것’이라는 말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차마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련다.
그러나 소위 ‘불법 사람’ 신세가 된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곳도 없다. 아무도 아닌 자(Nobody), 즉 투명인간 내지는 불가촉천민 취급을 받는다.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오직 인내의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강요된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게 ‘고통은 견디는 것’이라는 말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차마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련다.
지난 2월10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게 3월7일까지 이 나라를 떠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법무부 당국은 허위 취업을 추방 사유로 꼽지만, 이주노조 활동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치졸한 꼼수라는 점은 명백하다. 합법 노동자 신분인 미셸 위원장을 추방해 이주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주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 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해온 전례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마석 가구공단을 방문해 이른바 불법 사람 문제에 대해 ‘휴머니즘’으로 푼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문제는 유례없는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스탑 크랙다운의 가수 네팔인 미누(미노드 목탄)가 2009년 10월에 강제 추방된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이주노동자들은 또 얼마나 강제추방의 위협에 노출되어야 했던가. 필자는 이런 나라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다문화 사회’라는 정책도 그렇고, ‘국격’이라는 말도 몹시 불편하다. 속 좁은 나라, 대한민국의 위선을 분식하려는 잘못된 언어들로 들리기 때문이다.
2월26일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인들은 총회에서 미셸 위원장의 강제출국을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 캠페인을 벌였다. 고은, 구중서, 현기영, 이시영, 도종환 등 115명의 문인들이 서명했다. 국제앰네스티도 국제 이슈화할 예정이다. 19세기 오스트리아 법학자 폰 예링이 “법의 목적은 평화”라고 했다. 법이 불의가 되고, 정의가 불법이 되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른바 공정사회 플랜은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 정치’로는 구현될 수 없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2011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이 눈에 띈다. 미셸 위원장 문제는 무엇이 더 큰 대한민국인가를 묻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입력 : 2011-02-28 19:14:59ㅣ수정 : 2011-02-28 19:15:00
추방자가 늘고 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에 없이 추방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방의 영역은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가리지 않는다. 가난하고 힘없는 내국인들은 지금 이곳에서 ‘한국인으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가’를 토로하며 한숨을 짓는다.

지난 2월10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에게 3월7일까지 이 나라를 떠나라는 출국명령을 내렸다. 법무부 당국은 허위 취업을 추방 사유로 꼽지만, 이주노조 활동을 용인하지 않으려는 치졸한 꼼수라는 점은 명백하다. 합법 노동자 신분인 미셸 위원장을 추방해 이주노조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주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역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표적 삼아 강제 단속하고 추방해온 전례를 보면 더욱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마석 가구공단을 방문해 이른바 불법 사람 문제에 대해 ‘휴머니즘’으로 푼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문제는 유례없는 강경책으로 일관했다. 스탑 크랙다운의 가수 네팔인 미누(미노드 목탄)가 2009년 10월에 강제 추방된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후해 이주노동자들은 또 얼마나 강제추방의 위협에 노출되어야 했던가. 필자는 이런 나라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다문화 사회’라는 정책도 그렇고, ‘국격’이라는 말도 몹시 불편하다. 속 좁은 나라, 대한민국의 위선을 분식하려는 잘못된 언어들로 들리기 때문이다.
2월26일 한국작가회의 소속 문인들은 총회에서 미셸 위원장의 강제출국을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 캠페인을 벌였다. 고은, 구중서, 현기영, 이시영, 도종환 등 115명의 문인들이 서명했다. 국제앰네스티도 국제 이슈화할 예정이다. 19세기 오스트리아 법학자 폰 예링이 “법의 목적은 평화”라고 했다. 법이 불의가 되고, 정의가 불법이 되는 세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른바 공정사회 플랜은 입으로만 떠드는 ‘구호 정치’로는 구현될 수 없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니, ‘2011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이 눈에 띈다. 미셸 위원장 문제는 무엇이 더 큰 대한민국인가를 묻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