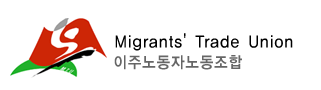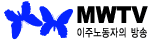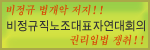글 수 3,514
중소기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맹점으로 인력난"
김청환기자 chk@hk.co.kr
외국인 근로자 배치 기준 불합리… 소규모 사업장 애로
전문가들 "소규모 사업장에 쿼터 줘야"… '이동제한제' 등 대안
전문가들 "소규모 사업장에 쿼터 줘야"… '이동제한제' 등 대안
김청환기자 chk@hk.co.kr
- 관련기사
전북 무주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던 김모(59)씨는 지난해 33억여원 규모의 부도를 냈다. 농협을 비롯한 국내ㆍ외 주문량은 넘치지만 인력 부족으로 주문량의 10%밖에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은 외국인고용허가제 규정 때문이다.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할당하는데 이 회사에 배정된 쿼터는 겨우 10명이었다.
2004년 도입된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정 기준이 불합리해 소규모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5명 이하, 11~50명은 10명 이하, 51~100명은 15명 이하, 101~150명은 20명 이하, 151~200명은 25명 이하, 201~300명은 30명 이하, 301~500명은 40명 이하, 501인 이상은 50명 이하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다소 배려를 해 줬지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치 않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들은 부족 인력이 30명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300명 미만 업체의 평균 인력부족률(4.16%)보다 부족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 인원을 20% 상향 조정해 주지만 그래 봐야 2, 3명 더 채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04년 도입된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배정 기준이 불합리해 소규모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5명 이하, 11~50명은 10명 이하, 51~100명은 15명 이하, 101~150명은 20명 이하, 151~200명은 25명 이하, 201~300명은 30명 이하, 301~500명은 40명 이하, 501인 이상은 50명 이하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다소 배려를 해 줬지만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치 않다.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들은 부족 인력이 30명이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300명 미만 업체의 평균 인력부족률(4.16%)보다 부족률이 높은 업종의 경우 사업장별 허용 인원을 20% 상향 조정해 주지만 그래 봐야 2, 3명 더 채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 쪽에 좀더 쿼터를 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농촌 지역 산업단지의 경우 이동제한제를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 독일의 탄광 지역은 외국인근로자를 들여올 때 사업장 이동 지역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작년부터 제조업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외국인고용허가제 적용 때 지역별 노동 수급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내국인 구인알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게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