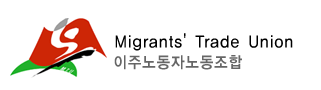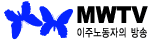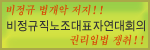글 수 3,514
남은 것은 '전신화상뿐'…무너진 '코리안드림'
 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민의날'이다. 우리나라에도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기 위해 해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병마와 싸우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민의날'이다. 우리나라에도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기 위해 해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늘고 있지만, 일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한 채 병마와 싸우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계속 방글라데시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같은 고통을 겪지는 않을 텐데..."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에 살고 있는 다카(31.가명) 씨.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지난 2004년 7월 부모를 고국에 남겨둔 채 한국에 입국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다카 씨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곳은 못과 나사를 만드는 공장이었고, 일은 힘들었다.
2개월 뒤 다카 씨는 천안의 파이프 제조 공장으로 일터를 옮겼다. 하루 종일 꼬박 일해도 손에 주어지는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이마저도 인색한 사장 때문에 5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공장 3군데를 거쳐 다다른 곳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파이프 제조 공장이었다. 이곳 사장은 다카 씨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업무량을 많이 소화한다며 좋아했다.
똑같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고된 노동 강도였지만 다카 씨는 매달 120여만 원을 꼬박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기만 했다. 자신의 생활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모에게 송금할 때면 더 없는 보람을 느꼈다.
지난 2007년 지독히 추운 겨울이었다. 난로 옆에서 일을 하던 다카 씨를 시뻘건 화마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난로 위에 놓여 있던 화공약품이 폭발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다카 씨는 손과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병원 생활은 8개월 동안 지리하게 이어졌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도 했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어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비참했어요"
다카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은 사장에 대한 원망도 컸다. 사장은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다. 그 사실이 다카 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사고 발생 2년째. 다카 씨는 일주일에 2~3차례씩 영등포에 있는 병원을 찾는다. 피부이식수술을 위해서다.
"수술이 끝나는대로 한국을 떠날 거에요"
하지만 다카 씨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대신 고국에 돌아가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학교 2학년 때 경제학을 공부하다 그만뒀어요. 그 때 공부를 계속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인터뷰 내내 화상에 일그러진 손을 장갑으로 가리고 있던 다카 씨의 눈가에 끝내 눈물이 고였다.
◈ 이주노동자 157명당 1명꼴 산재로 '코리안 드림' 접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가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산재를 입은 국내 이주노동자는 3967명으로, 157명당 1명꼴이었다.
올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수가 54만 9282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확률이다.
'코리안 드림'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입국한 이들이 산재를 당해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카 씨처럼 산재 보상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사측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 신분을 빌미로 노동자의 산재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박선희 사무국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벌금을 내는 대신 자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주가 보상금 지급을 미루거나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지급해 이주노동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박 사무국장은 "일부 이주노동자는 다친 몸으로 일할 것을 강요받기도 한다"면서 "특히 일하다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 입증이 어려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frica@cbs.co.kr

"계속 방글라데시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같은 고통을 겪지는 않을 텐데..."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외국인노동자 쉼터에 살고 있는 다카(31.가명) 씨.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지난 2004년 7월 부모를 고국에 남겨둔 채 한국에 입국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한국 생활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다카 씨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곳은 못과 나사를 만드는 공장이었고, 일은 힘들었다.
2개월 뒤 다카 씨는 천안의 파이프 제조 공장으로 일터를 옮겼다. 하루 종일 꼬박 일해도 손에 주어지는 돈은 고작 100만 원 남짓. 이마저도 인색한 사장 때문에 5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공장 3군데를 거쳐 다다른 곳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파이프 제조 공장이었다. 이곳 사장은 다카 씨가 다른 노동자에 비해 업무량을 많이 소화한다며 좋아했다.
똑같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고된 노동 강도였지만 다카 씨는 매달 120여만 원을 꼬박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기쁘기만 했다. 자신의 생활비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모에게 송금할 때면 더 없는 보람을 느꼈다.
지난 2007년 지독히 추운 겨울이었다. 난로 옆에서 일을 하던 다카 씨를 시뻘건 화마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난로 위에 놓여 있던 화공약품이 폭발하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다카 씨는 손과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병원 생활은 8개월 동안 지리하게 이어졌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생각도 했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어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비참했어요"
다카 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은 사장에 대한 원망도 컸다. 사장은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다. 그 사실이 다카 씨를 더욱 힘들게 했다.
사고 발생 2년째. 다카 씨는 일주일에 2~3차례씩 영등포에 있는 병원을 찾는다. 피부이식수술을 위해서다.
"수술이 끝나는대로 한국을 떠날 거에요"
하지만 다카 씨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대신 고국에 돌아가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대학교 2학년 때 경제학을 공부하다 그만뒀어요. 그 때 공부를 계속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인터뷰 내내 화상에 일그러진 손을 장갑으로 가리고 있던 다카 씨의 눈가에 끝내 눈물이 고였다.
◈ 이주노동자 157명당 1명꼴 산재로 '코리안 드림' 접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가 산업안전공단의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 산재를 입은 국내 이주노동자는 3967명으로, 157명당 1명꼴이었다.
올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수가 54만 9282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확률이다.
'코리안 드림'이라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입국한 이들이 산재를 당해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카 씨처럼 산재 보상금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사측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 신분을 빌미로 노동자의 산재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박선희 사무국장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며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고용주는 벌금을 내는 대신 자비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주가 보상금 지급을 미루거나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지급해 이주노동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해 애를 먹는다는 것이다.
박 사무국장은 "일부 이주노동자는 다친 몸으로 일할 것을 강요받기도 한다"면서 "특히 일하다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 입증이 어려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fric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