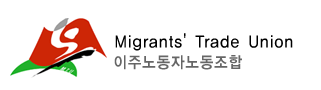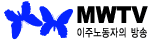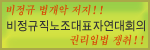글 수 3,514
|
"코리안드림 '이주' 두 글자에 갇혔어요" |
|
[우리 곁의 소외된 이웃] <하> 이주민 |
| 전대식 기자 |
누군가는 '일자리'를 찾아 바다를 건너 한국에 왔다. 그런 사람만 벌써 100만 명이다. 또 어떤 이는 '삶과 희망의 보금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어 시집 왔다.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라는 단어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얼마쯤은 차별과 선입견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각각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세밑을 앞둔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꿈은 같았다. '사람답게 살고 일하고 싶다'는 거였다.
#이주노동자 주거인권 걸음마 수준
3년 전 봄 방글라데시에서 부산으로 돈을 벌러 온 칸다(35·가명)씨. 부산 사상공업지역에서 12시간을 일하고 돌아가는 곳은 회사가 마련해 준 컨테이너 기숙사. 5평 남짓한 방에 칸다씨 이외에 베트남, 중국 노동자 10명이 산다. 난방시설은 전기장판, 전기난로가 전부다. 말이 장판이지 서너 명이 누우면 자리가 모자란다. 언 방에서 자다 보니 항상 피곤하고,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산다. 칸다씨는 "사글세에 사는 동료가 부럽지만 방값이 비싸 따로 나가 살 엄두를 못낸다"고 말했다.
베트남 노동자 캄푸(29·가명)씨는 다른 동료와 함께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방에서 산다. 그는 매달 70만원 정도 버는데, 이중 10만원을 월세로 부담한다. 여기에 전기·수도료, 난방비를 제외하면 손에 남는 돈은 50만원이 채 안된다.

캄푸는 "한국에 올 때 낸 빚을 아직 반도 못 갚았는데, 새해에도 이런 처지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100만 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체의 관심 증대로 체불 임금이나 폭력, 불법체류를 해결하는 제도는 속속 생겨났지만 주거인권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가 지난 9월께 부산 사상, 사하 일대 이주노동자 숙소 1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주거면적은 30.2㎡(9.1평)로 전국 평균(69.2㎡·20.9평)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조사대상 숙소 중 절반가량만 부엌이 있고, 상당수가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어 '잠자리'보다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대기 장소'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 장임숙 박사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객관적인 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값 비싸고 임금 짜고…
5평에 10명 살기도 해요"
이주노동자 주거인권 실종
이주여성 취업 지원 감감
#이주여성들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수는 12만5천197명이며 이중 10만9천668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들 상당수가 한글 교육, 한국문화 교육, 요리 등 '한국 동화 교육'에만 치우치고 있어 이들이 현실적·장기적으로 원하고 있는 '취업' 부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6월 전북발전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가 다문화가정 2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첫째가 취업과 직장문제였으며 두번째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온 지 3년 된 몽골 출신 자가(29·여·부산 북구)씨는 "몽골에서 대학을 나와 전공인 회계 분야에서 5년간 경력을 쌓았지만 한국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며 "그나마 지난해 다문화강사를 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가족 앞에서도 당당함이 느껴져 좋았는데 올해 다시 일을 찾으려니 쉽지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권미경 상담지원팀장은 "이주여성들의 80~90%가 취업을 원하지만 식당과 공장 이외에 이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이주여성 상당수가 사회 전면에 나서지 못한 채 집안에만 머물러 있다"며 "이주여성들이 가진 능력을 한국사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하는 통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식·이현정 기자 pro@busan.com
누군가는 '일자리'를 찾아 바다를 건너 한국에 왔다. 그런 사람만 벌써 100만 명이다. 또 어떤 이는 '삶과 희망의 보금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어 시집 왔다.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라는 단어는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고, 얼마쯤은 차별과 선입견을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각각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왔지만 세밑을 앞둔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꿈은 같았다. '사람답게 살고 일하고 싶다'는 거였다.
#이주노동자 주거인권 걸음마 수준
3년 전 봄 방글라데시에서 부산으로 돈을 벌러 온 칸다(35·가명)씨. 부산 사상공업지역에서 12시간을 일하고 돌아가는 곳은 회사가 마련해 준 컨테이너 기숙사. 5평 남짓한 방에 칸다씨 이외에 베트남, 중국 노동자 10명이 산다. 난방시설은 전기장판, 전기난로가 전부다. 말이 장판이지 서너 명이 누우면 자리가 모자란다. 언 방에서 자다 보니 항상 피곤하고, 겨울이면 감기를 달고산다. 칸다씨는 "사글세에 사는 동료가 부럽지만 방값이 비싸 따로 나가 살 엄두를 못낸다"고 말했다.
베트남 노동자 캄푸(29·가명)씨는 다른 동료와 함께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방에서 산다. 그는 매달 70만원 정도 버는데, 이중 10만원을 월세로 부담한다. 여기에 전기·수도료, 난방비를 제외하면 손에 남는 돈은 50만원이 채 안된다.
이주노동자 100만 시대를 맞아 정부와 기업체의 관심 증대로 체불 임금이나 폭력, 불법체류를 해결하는 제도는 속속 생겨났지만 주거인권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다.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가 지난 9월께 부산 사상, 사하 일대 이주노동자 숙소 1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주거면적은 30.2㎡(9.1평)로 전국 평균(69.2㎡·20.9평)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조사대상 숙소 중 절반가량만 부엌이 있고, 상당수가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어 '잠자리'보다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대기 장소'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 장임숙 박사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객관적인 주택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값 비싸고 임금 짜고…
5평에 10명 살기도 해요"
이주노동자 주거인권 실종
이주여성 취업 지원 감감
#이주여성들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우리나라 결혼이민자 수는 12만5천197명이며 이중 10만9천668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들 상당수가 한글 교육, 한국문화 교육, 요리 등 '한국 동화 교육'에만 치우치고 있어 이들이 현실적·장기적으로 원하고 있는 '취업' 부분에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6월 전북발전연구소 여성정책연구소가 다문화가정 2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첫째가 취업과 직장문제였으며 두번째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온 지 3년 된 몽골 출신 자가(29·여·부산 북구)씨는 "몽골에서 대학을 나와 전공인 회계 분야에서 5년간 경력을 쌓았지만 한국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며 "그나마 지난해 다문화강사를 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가족 앞에서도 당당함이 느껴져 좋았는데 올해 다시 일을 찾으려니 쉽지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권미경 상담지원팀장은 "이주여성들의 80~90%가 취업을 원하지만 식당과 공장 이외에 이들을 받아주는 곳이 없어 이주여성 상당수가 사회 전면에 나서지 못한 채 집안에만 머물러 있다"며 "이주여성들이 가진 능력을 한국사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으로 진출하는 통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대식·이현정 기자 pr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