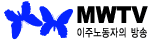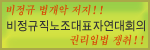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 ‘체불 임금 확인서’가 생명 증표인 불법체류자 참파 | ||||||||||||||
| ||||||||||||||
| ||||||||||||||
방글라데시인 참파(가명·28)씨의 가방에는 비닐로 정성껏 꼭 싸맨 종이 뭉치가 들어있다. 그 종이 뭉치는 참파의 한국생활 10년을 증언한다. 종이에는 참파씨가 손으로 써내려간 체불임금 내역과 회사 사장이 ‘체불임금 갚겠다’라고 도장까지 찍은 각서, 노무사가 작성한 ‘체불 임금 확인서’ 따위가 들어있다. 지난 4월28일 오후 9시, 참파씨가 기자를 만나 앞 뒤 설명 없이 앞장 서 간 곳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일했던 경기도의 한 전사지(인쇄종이) 공장이었다. 제대로 된 문도, 간판조차도 없는 33㎡(10평) 남짓 허름한 공장이었다.
“소송 취하하면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네가 나를 안 믿어서 벌금 700만원 물었어.” “벌금 나온 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파산한) 사장님은 월급 준다는 각서에 도장까지 찍고도 약속 안 지켰는데, 공장장님은 말로만 했어요. 법적으로 걸어 놓은 거 취소하면 다음 날 (단속에)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렇지만 법에 걸려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도 받을 수 있어요. 공장장님은 회사라도 받았잖아요. 사장님 나 생각 안했어요. 한국인이라면 이렇게 했겠어요. 나 외국인이라서 이런 거 잖아요. 돈 없다면서 기계도 샀어요.” “지금 회사 사정이 말이 아니다. 나도 모르겠다. 회사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신용이 나빠져서 더 이상 돈 빌릴 곳도 없고.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사장님이랑 법적으로 다퉈라.” 한바탕 공방이 오고간 후에, 참파씨가 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참파씨는 19살 되던 2001년 한국에 왔다. 방글라데시 신문에 난 한국 공장의 구인광고가 한국행을 이끌었다. 참파씨는 “방글라데시에 가족이 12명이예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 10년간 방글라데시에 간 건 딱 한 번. 2003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뿐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상담 이유 70~80%는 임금체불 임금체불은 인쇄공장에서 받지 못한 500여 만 원만 있는 게 아니었다. 2008년 접착테이프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 참파씨는 그곳에서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 공장에서 밀린 돈은 800만 원. 공장은 문을 닫았고, 참파씨는 이 공장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참파씨가 한국에서 일하고 받지 못한 돈은 모두 1300만 원. 이 돈이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식구 12명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큰 액수이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입국한 참파씨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신분이다. 그는 “내가 ‘불법 사람’이라는 거 알고 일부러 월급 안 준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재 참파씨는 비닐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주·야 2교대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이 가운데 70만 원 정도를 방글라데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낸다. 남은 돈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기도 빠듯하지만 참파씨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노숙인들에게도 후원금을 조금씩 보내고 있었다. “방글라데시에 노숙자 많아요. 주로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어요. 돈 벌면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얼마 전, 참파씨의 형과 동생이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일하러 들어왔다. 그러나 참파씨는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 언제 어디서 단속에 걸려 추방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저는 불법 사람이기 때문에 추방되면 다시 못 돌아와요. 그래서 공장 밖으로 잘 안 나가요” | ||||||||||||||
글 수 3,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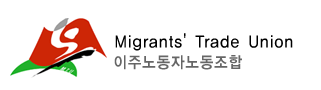
 ilhostyle@sisain.co.kr
ilhostyle@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