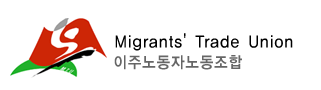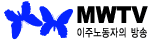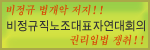글 수 3,514
신종플루에 ‘방치’ 된 이주노동자http://migrant.kr/?document_srl=274952009.09.17 15:58:25 (*.142.108.180) 10언론사 위클리경향 28호
보도날짜 2009.09.17
기자명 임석빈 인턴기자 zomby011@hanmail.net
원문보기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09171415391&pt=nv
ㆍ병원 출입 꺼려 감염자 발견 어려워…외국인 대상 거점병원 지정해야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반 병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소를 찾는다. <유성문 객원기자>
지난 9월10일까지 확인된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7577명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국적취득자와 불법체류자 포함)이 110만6884명으로 인구의 2.2%를 차지함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확진 환자는 160명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확진 환자는 ‘0’명이다. 따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종플루는 지역사회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감염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70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의 경우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불법’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자신의 기록이 남는 병원 출입을 꺼린다. 이렇듯 국내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여기에 미국에서 사람 간의 감염사례가 발견되면서 이같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은 한층 더해졌다.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이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프레마랄(스리랑카·39)는 “주위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람(외국인 근로자)은 보지 못했다”면서 “분명 있겠지만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마랄의 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감기의 경우 대개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다. 따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서 감기와 증세가 비슷한 신종플루 환자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998년 산업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해 2007년까지 불법 체류를 ‘경험’한 프레마랄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서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라고 전했다.
자나카(스리랑카·38)는 10년차 불법체류자다.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는 공장에서 일한다.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신종플루와 관련한 별다른 교육이 없다. 자나카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신종플루가 의심돼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유는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병원이든 보건소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약국에 갈 경우가 생기면 국적취득자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탁한다. 신종플루는 물론 모든 질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자나카는 “우리 같은(불법체류자)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쉼터나 의료봉사단체를 통해 (신종플루를) 진료받고 싶다”고 간절한 심정을 드러냈다. 자나카처럼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지원센터나 의료봉사 단체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곳 역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이 가운데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서성일 기자>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에서는 매주 화·목·일요일에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한다. 조금호 이사장은 “신종플루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수업을 멈춰야 한다”면서 “책임자로서 지켜보기 아슬아슬하다”고 토로했다. 조 이사장은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 연락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손을 자주 씻고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일러주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조 이사장은 “이들에게는 건강이 자산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방하라는 말 외엔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의원(외노의원)에서 근무하는 배은분 간호사(48)는 며칠 전에 자신이 불법체류자라고 밝힌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감기증세를 호소하며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 배 간호사는 외노의원에서는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판단할 장비가 없으니 보건소로 가 보라고 말했다. 이튿날 배 간호사는 보건소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잔뜩 화가 난 보건소 직원은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무작정 보건소로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신종플루인지 확인은 하고 보냈느냐”고 따졌다. 배 간호사는 “타미플루(신종플루 치료제)가 없어서 보낸 것인데 오히려 화를 내더라”면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혀를 찼다. 결국 신종플루가 의심된 외국인 근로자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그가 신종풀루 감염자라면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확산을 방치한 셈이다.
“외국인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따르면 2009년 6월 외국인 근로자는 70만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18만4000여 명을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는 50만명이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비싼 진료비 때문에 병원을 기피한다. 게다가 신분까지 불안정한 불법체류자는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병원은 꿈도 꾸지 못한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홍보관리반 김혜정씨는 “아직은 외국인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서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타미플루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신원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센터 등에 12개 언어로 번역된 신종플루 예방 책자를 배포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김씨는 “아주 (대책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자국민에 대한 대책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행안부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의료시스템의 ‘음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양지’에 나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화사랑나눔 의료봉사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진료하는 이희일씨(35)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종플루를 의심해 스스로 병원을 찾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타미플루가 없는 의료봉사단체에서 해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신종플루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지고 있다. 그렇기에 체류의 적법성을 떠나 이들을 관리해야 신종플루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씨는 “거점병원을 지정하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의료봉사 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보도날짜 2009.09.17
기자명 임석빈 인턴기자 zomby011@hanmail.net
원문보기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0909171415391&pt=nv
ㆍ병원 출입 꺼려 감염자 발견 어려워…외국인 대상 거점병원 지정해야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반 병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진료소를 찾는다. <유성문 객원기자>
지난 9월10일까지 확인된 국내 신종플루 확진 환자는 7577명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국적취득자와 불법체류자 포함)이 110만6884명으로 인구의 2.2%를 차지함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확진 환자는 160명이 넘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확진 환자는 ‘0’명이다. 따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종플루는 지역사회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감염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70만명이나 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자의 경우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드물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불법’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자신의 기록이 남는 병원 출입을 꺼린다. 이렇듯 국내 의료시스템에서 벗어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여기에 미국에서 사람 간의 감염사례가 발견되면서 이같은 대책 마련의 시급성은 한층 더해졌다.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이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프레마랄(스리랑카·39)는 “주위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사람(외국인 근로자)은 보지 못했다”면서 “분명 있겠지만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마랄의 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감기의 경우 대개는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다. 따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게서 감기와 증세가 비슷한 신종플루 환자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1998년 산업 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해 2007년까지 불법 체류를 ‘경험’한 프레마랄은 “불법체류자의 경우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서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라고 전했다.
자나카(스리랑카·38)는 10년차 불법체류자다.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는 공장에서 일한다.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신종플루와 관련한 별다른 교육이 없다. 자나카는 “지금은 건강하지만 신종플루가 의심돼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유는 언제 잡힐지 모르기 때문이다. 병원이든 보건소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약국에 갈 경우가 생기면 국적취득자나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탁한다. 신종플루는 물론 모든 질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자나카는 “우리 같은(불법체류자) 사람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쉼터나 의료봉사단체를 통해 (신종플루를) 진료받고 싶다”고 간절한 심정을 드러냈다. 자나카처럼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지원센터나 의료봉사 단체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곳 역시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이 가운데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서성일 기자>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에서는 매주 화·목·일요일에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한다. 조금호 이사장은 “신종플루 환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수업을 멈춰야 한다”면서 “책임자로서 지켜보기 아슬아슬하다”고 토로했다. 조 이사장은 한국이주민건강협회에 연락해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손을 자주 씻고 건강관리를 잘하라고 일러주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조 이사장은 “이들에게는 건강이 자산이기 때문에 스스로 예방하라는 말 외엔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의원(외노의원)에서 근무하는 배은분 간호사(48)는 며칠 전에 자신이 불법체류자라고 밝힌 남자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감기증세를 호소하며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다. 배 간호사는 외노의원에서는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판단할 장비가 없으니 보건소로 가 보라고 말했다. 이튿날 배 간호사는 보건소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잔뜩 화가 난 보건소 직원은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를 무작정 보건소로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신종플루인지 확인은 하고 보냈느냐”고 따졌다. 배 간호사는 “타미플루(신종플루 치료제)가 없어서 보낸 것인데 오히려 화를 내더라”면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혀를 찼다. 결국 신종플루가 의심된 외국인 근로자의 행방은 묘연해졌다. 그가 신종풀루 감염자라면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확산을 방치한 셈이다.
“외국인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따르면 2009년 6월 외국인 근로자는 70만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18만4000여 명을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는 50만명이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은 비싼 진료비 때문에 병원을 기피한다. 게다가 신분까지 불안정한 불법체류자는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병원은 꿈도 꾸지 못한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홍보관리반 김혜정씨는 “아직은 외국인을 위한 대책이 없다”면서 “신종플루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타미플루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신원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센터 등에 12개 언어로 번역된 신종플루 예방 책자를 배포하는 것 외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김씨는 “아주 (대책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자국민에 대한 대책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면서 “행안부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의료시스템의 ‘음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스스로 ‘양지’에 나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화사랑나눔 의료봉사단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진료하는 이희일씨(35)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종플루를 의심해 스스로 병원을 찾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타미플루가 없는 의료봉사단체에서 해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외국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신종플루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퍼지고 있다. 그렇기에 체류의 적법성을 떠나 이들을 관리해야 신종플루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씨는 “거점병원을 지정하듯이 외국인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의료봉사 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