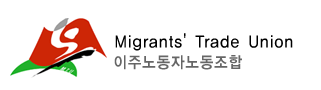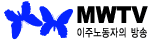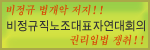글 수 3,514
일자리 가뭄, 고물가, 고환율 이주노동자 ‘한숨 3배’
불경기 영향 일자리 가뭄
고물가에 생활비 20~30%↑
고환율로 고향 송금액 줄어
노현웅 기자
스리랑카에서 온 하산(가명·29)은 경남 김해의 한 시장통에서 7개월째 물건 나르기 등 잡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다. 지난 2월 일하던 업체 쪽으로부터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취업을 세 차례로 제한한 규정 때문에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공장에 덜컥 들어가기도 겁이 난다”며 “변변한 일자리는 찾기가 너무 힘들고, 이런 잡일마저 없으면 당장 생활조차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불경기로 ‘일자리 가뭄’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최근 물가와 환율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중소·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 근교의 공단지역에서도 안정적 일감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인천 부평공단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외국인을 합쳐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일거리가 없어서 전부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런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추석이 지난 뒤 일주일씩 더 휴가를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평공단에서 오래 일했다는 한 이주노동자는 “공장을 다녀도 일감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요즘 동료들을 만나면 다들 돈 걱정뿐”이라고 토로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와 환율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006년 초 한국에 온 라나위나(25·스리랑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달 100만원 가량을 고향으로 송금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80만원을 맞추기도 벅차다. 잔업수당을 합쳐 한 달에 140만원 가량을 받는데, 월세와 밥값, 교통비 등을 빼고 나면 요즘은 90만원도 남기기 힘들어졌다고 한다. 그는 “줄인다고 하는데 밥값 등 안 쓸 수 없는 생활비가 이전보다 20~30%는 더 드는 것 같다”며 “쉬는 날 피시방에 가거나 놀러 가는 대신 그냥 집에서 지내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두 자녀의 학비를 대야 하는 이슬람(50·방글라데시)은 환율 때문에 송금 부담이 훨씬 커졌다. 그는 “송금액은 똑같은데 고향 집에서 받는 돈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며 “게다가 방글라데시도 몇 년 새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지금 벌이로는 아이들 학비를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8년째 불법체류 중인 그는 이런 사정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도 당분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우삼렬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겪는 법인데, 우리 사회 맨 밑바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의적인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로 이중의 고통을 주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불경기 영향 일자리 가뭄
고물가에 생활비 20~30%↑
고환율로 고향 송금액 줄어
노현웅 기자
스리랑카에서 온 하산(가명·29)은 경남 김해의 한 시장통에서 7개월째 물건 나르기 등 잡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잇고 있다. 지난 2월 일하던 업체 쪽으로부터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회사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는 “취업을 세 차례로 제한한 규정 때문에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공장에 덜컥 들어가기도 겁이 난다”며 “변변한 일자리는 찾기가 너무 힘들고, 이런 잡일마저 없으면 당장 생활조차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불경기로 ‘일자리 가뭄’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이 최근 물가와 환율까지 가파르게 오르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중소·제조업체가 몰려 있는 서울 근교의 공단지역에서도 안정적 일감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인천 부평공단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외국인을 합쳐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일거리가 없어서 전부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런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추석이 지난 뒤 일주일씩 더 휴가를 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부평공단에서 오래 일했다는 한 이주노동자는 “공장을 다녀도 일감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요즘 동료들을 만나면 다들 돈 걱정뿐”이라고 토로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와 환율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006년 초 한국에 온 라나위나(25·스리랑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달 100만원 가량을 고향으로 송금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80만원을 맞추기도 벅차다. 잔업수당을 합쳐 한 달에 140만원 가량을 받는데, 월세와 밥값, 교통비 등을 빼고 나면 요즘은 90만원도 남기기 힘들어졌다고 한다. 그는 “줄인다고 하는데 밥값 등 안 쓸 수 없는 생활비가 이전보다 20~30%는 더 드는 것 같다”며 “쉬는 날 피시방에 가거나 놀러 가는 대신 그냥 집에서 지내는 일이 잦아졌다”고 말했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두 자녀의 학비를 대야 하는 이슬람(50·방글라데시)은 환율 때문에 송금 부담이 훨씬 커졌다. 그는 “송금액은 똑같은데 고향 집에서 받는 돈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다”며 “게다가 방글라데시도 몇 년 새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지금 벌이로는 아이들 학비를 온전히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8년째 불법체류 중인 그는 이런 사정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도 당분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우삼렬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통을 겪는 법인데, 우리 사회 맨 밑바닥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의적인 임금 체불과 부당 해고로 이중의 고통을 주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