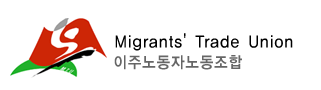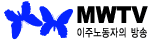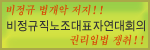글 수 3,514
이주노동자 밀집지 빈민가 전락 우려
자체적 공동체 형성해 자국어만 사용
원래 주민들 '슬럼화' 우려 타지로 떠나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정부 정책이나 법원 판결 등에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면서 이들 집단이 사회 갈등을 촉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이미 곳곳에 자리 잡은 이주노동자 밀집지역들이 미국 사회의 ‘게토’(ghetto)처럼 빈민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달라진 위상은 이들의 노조를 인정한 법원 판결에서 잘 나타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노측의 손을 들어줬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으로 결성된 이 노동조합에는 불법체류자도 상당수 포함돼 있었으나 법원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990년대 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후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 조직체인 ‘필리핀인 공동체’가 92년 9월 서울 자양동성당에 설립됐다가 소수민족 집단거주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 정부의 압력으로 한달 만에 해체된 사실에 견주어보면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외국인 노동자 세력화에 대한 불안과 경계의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등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는 이들의 사회·문화적 공동체 형성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한 수도권 한 지역의 경우 필리핀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만 쓰고, 그들끼리 고리대금업을 하는 등 ‘필리핀촌’으로 바뀌면서 원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맞추려고 하지만 외국인 집단촌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크다”면서 “쓰레기 문제, 치안 문제, 취업기회 박탈감 등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이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2007.04.26 (목) 08:47